예전에 읽다가 덮었는데, 다시 펼쳤다가 매우 재밌게 읽었다. 2년쯤 전에 덮었던 이유는 서두의 논의가 당시 내게 너무 무겁고 우울하게 느껴졌고, 정치철학과 문화비평이 혼합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책에 조금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정치철학보다는 실제의 실천이나 현실을 살펴보고, 실증적인 이야기를 하는 텍스트를 훨씬 선호했다. 역시 독서도 ‘때’라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자본주의는 사람들의 삶뿐 아니라 생각의 지평까지 잠식하고 있고, 프레드릭 제임슨이 말했듯 “자본주의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보다 세상의 종말을 상상하는 게 더 쉽다”. 우리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그런 사회가 오기는 할지 상상하지 못한다. 대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할 수 없는 현재와 같은 상태를 일컬어 마크 피셔는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라 명명한다. 그것은 사회주의 리얼리즘보다 더 스탈린주의적이고, 일획적이며, 오늘날 세계에 심각한 징후를 부과한다. 하나는 개인화된 우울증이고, 다른 하나는 생태위기다. 우울증이야말로 자본주의가 낳은 정치적 문제인데, 우리는 이 병리적 현상을 회복할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
자본주의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둥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실패한 체계다. 우리는 “대안은 없다”, “역사의 종언” 따위의 체념과 냉소를 넘어 새로운 정치적 주체를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정치는 자본주의 리얼리즘이 낳은 이 파국적 양상과 균열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것에 맞서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영년의 자리에서 대항세력을 만드는 것이다.
“가장 사소한 사건들도 자본주의 리얼리즘 아래서 가능성의 지평을 표지해 온 그 반동의 회색 장막에 구멍을 낼 수 있다.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다시 한 번 무엇이든 가능해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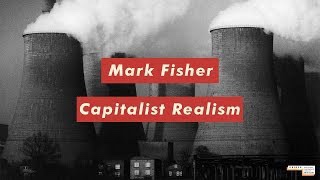
댓글 남기기